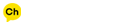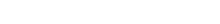수차례 자살시도자 김씨 “나를 살린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4,905회 작성일 06-11-23 11:44본문
수차례 자살시도자 김씨 “나를 살린 것은…”
김순이(33·여·가명)씨는 조용히 누웠다. 공책을 꺼내 무슨 말이든 적으려 했으나 낱말 하나 떠오르지 않았다. 잠이 오기 시작하자 어렴풋이 생각했다.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몇시간이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듯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옆에는 쥐약 봉투 하나가 뒹굴었고,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4개나 더 놓여 있었다. 김씨는 여관방을 나와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1998년 그의 첫번째 ‘자살 시도’는 그렇게 끝났다. 직장 상사와 2년여를 사귀고 있던 어느날 그의 부인에게서 ‘협박과 애원, 절규가 뒤섞인 전화’를 받은 직후였다. 다행히 치사량에 이르지 않은 약 성분이 그를 살렸다.
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불화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유년시절의 상처는 김씨를 지금도 옥죄고 있다. 고통을 잊으려 일에 몰두한 그는 대학시절 광고공모전에 5차례나 입상했고 여러 광고기획사에서 특채 제안까지 받을 만큼 유능했다. 하지만 정신없이 일을 마친 뒤면 어김없이 20여년 동안 켜켜이 쌓인 ‘고통의 기억’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결국 1999년 신경정신과를 찾았으나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치료나 심리 상담만으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셈이다.
김씨는 지난 8월에도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폭풍이 몰아치던 날,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쫓겨 전남 여수를 찾았다. 한적한 곳을 수소문하다 오동도를 골랐지만 공교롭게 태풍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다시 부산으로 발길을 돌려 한 호텔 뒤 바위로 향했다. 하지만 난데없이 나타난 노숙자의 고함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동백호 근처의 다리였다. 난간에 올라섰으나 마침 지나던 시민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 살렸다. 3박4일 동안 오로지 ‘목숨을 버리기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닌, 악몽 같은 여행이었다.
자살 시도 때마다 그를 구한 건 넘기 힘든 난간이나 보호망 같은 ‘환경’이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 있던 경비원·노숙자 같은 ‘사람’이었다. 김씨는 “늘 ‘그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실천으로 이끄는 계기가 있게 마련이어서, 분명히 자살은 충동적”이라며 “건물 옥상을 통제하고 다리 난간을 높이거나 약물을 소량으로만 포장해 판매하는 등 자살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물에 부딪치면 이를 해결하려고 한발 물러나 생각하는 사이 ‘감정의 농도’가 옅어져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영국에서는 1998년 특정 알약을 하나의 포장에 16정 이상 담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령이 통과된 뒤 약물 과다복용을 통한 자살이 전년도에 견줘 21%까지 떨어졌다. 이 법령은 제약회사가 했다. 물약도 160㎖를 넘으면 안된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듀크 엘링턴 다리에서는 한해 3.67명이 자살했으나, 난간을 설치한 뒤 최근 5년 동안 한해 평균 자살자가 1명 이내로 줄었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서는 1937년 다리가 생긴 뒤 1300여명이 자살했는데도 미관 문제 등을 들어 난간을 설치하지 않다가, 최근 한 영화제작자가 실제 자살하는 사람 19명의 모습을 찍은 것이 밝혀지자 난간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이 싹트고 있다. 23일 발족하는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앞으로 다리, 건물 옥상, 약품 등 대표적인 자살 수단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사회 환경을 바꿈으로써 한해 1만명, 하루 34명꼴에 이르는 자살을 줄이자는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진식, 김기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