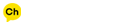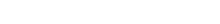"[다시보는 가족]<중> 새로운 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4,449회 작성일 06-09-22 15:51본문
《주부 박정숙(42·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씨는 딸만 둘인 게 아쉬웠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다. 얼마 전 딸만 둘 있는 친척의 칠순 잔치에서 그 집의 사위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 “나이든 사위들이 장인 장모와 손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고 온갖 재롱(?)을 다 부리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사위들이 처가의 대소사는 물론 장인 장모의 운전사로서 손발 노릇을 톡톡히 하더군요.”》
요즘엔 아들 노릇을 하는 사위들이 부쩍 늘었다. 가족계획이 시작된 1960, 70년대부터 딸만 둔 가정이 크게 늘어나 사위가 유일한 ‘남자 자식’인 집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사위가 처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딸만 있는 집의 맏사위인 회사원 이모(33·회사원) 씨는 “명절에는 ‘오전은 친가, 오후는 처가’가 정례화된 지 오래”라며 “서운해하는 어머니에게 ‘엄마, 난 거기서도 아들이야’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의 부인(29)은 “나도 딸 하나만 있는데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잘하면 아이가 배우지 않겠느냐”면서 “남편이 고마워 시댁에도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신세대 남성들은 여자 못지않은 감수성으로 처가 사람들을 살갑게 대한다. 이모(56·서울 용산구 한남동) 씨는 “남편에게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생일 선물과 꽃바구니를 사위에게 받고 감동했다”며 “요즘 젊은 남자들은 우리 세대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주부 이정희(46·서울 관악구 신림동) 씨도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 한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친척의 사위가 처조부와 처조모 제사까지 챙기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잘하는 사위’들은 며느리나 아들에겐 긴장감을 준다. 주부 양모(46) 씨는 “돈이 있는 집안에서는 유산 상속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사위를 경계할 정도”라고 전했다.
형제나 친구처럼 지내는 동서들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김모(45·대전 서구 둔산동) 씨는 “형제들끼리는 벌초 이야기, 집안 행사에 돈 내는 얘기를 나누지만 동서 3명 간에는 서로 얽힌 게 적으니까 부담 없이 휴가 정보에서부터 재테크 정보까지 함께 나눈다”며 “처제들이 자주 만나니까 동서 간의 친분도 두터워진다”고 말했다.
전통적 긴장 관계인 시누이와 올케 사이도 옛날 같지 않다. 주부 조성연(36·경기 용인시 신봉동) 씨는 “친구나 동서들에게는 라이벌 의식 탓인지 돈 이야기, 아이 성적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지 않는데 시누이에게만큼은 터놓고 말할 수 있다”며 “시누이는 진심으로 조카를 걱정해 준다”고 말했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는 “여성의 지위가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만 결정되던 시대에는 자매들의 남편이나 남자형제의 아내는 아웃사이더였지만 여성의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여성의 가족 위상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여성개발원 김영란 전문 연구원은 “옛날에는 출가외인이라고 딸에게는 유산도 안 물려줬지만 요즘 부모들은 엄연히 딸자식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변화를 감지한 딸도 친정 부모에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문명 기자-동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